eISSN: 2093-8462 http://jesk.or.kr
Open Access, Peer-revie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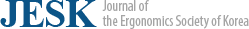
eISSN: 2093-8462 http://jesk.or.kr
Open Access, Peer-reviewed
Hong-In Cheng
, Min Chan Jeong
, Sangmun Shin
10.5143/JESK.2025.44.2.233 Epub 2025 May 06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cooperation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their subcontractors, 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of support programs as well as identifying strategies for sustaining the collaboration.
Background: It is common in South Korea for large corporations to subcontract wi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Despite the fact that subcontracting can increase efficiency and cost-effectiveness, it can also raise concerns abou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s subcontractors are often faced with higher accident rates due to a lack of adequate resources and support.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government-led co-prosperity cooperative programs and devise development strategies.
Method: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safety and health managers from 112 large corporations participating in the co-prosperity cooperation program. The survey examined organizational support structures,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provided to subcontractors, and safety incentive implementation. To enhance the survey findings, eight experts and corporate safety managers were interviewed in-depth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hallenges and best practices related to subcontractor safety management.
Results: Large corporations and public enterprises generally had structured support systems for subcontractor safety management, mid-sized enterprises exhibited lower adoption rates. The most common forms of support included risk assessments, hazard control, OSH training, and financial aid for safety improvements. The implementation of incentive systems for subcontractors, however, was inconsistent, and many subcontractors had difficulty utilizing the safety resources which were available to them.
Conclusion: Effective collaboration requires not only financial support but also the establishment of clear safety criteria, structured evaluation systems, and strong incentives for compliance. Large corporations should refine their support strategies to ensure that subcontractors can independently sustain high OSH standards beyond financial assistance.
Applic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policymakers and corporate decision-makers with practical insight into designing more effective co-prosperity cooperation programs. Large corporations and subcontractors can benefit from structured incentive mechanisms and industry-specific safety frameworks.
Keyword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tractor Subcontractor Co-prosperity cooperation program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대기업(원청)-협력업체(하청) 구조가 고착화되었다(Kim, 2019). 대규모 사업장과 공기업들은 약 40% 정도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조선업과 자동차 제조업(100%), 철강업(87.1%), 전기전자업(59.9%) 등에서는 사내하도급의 비율이 높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2; Korea Labor Institute, 2007). 협력업체 근로자의 비율은 일반 기업에서만 높은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높게 나타나며, 사내하도급과 관련한 문제는 사회적인 갈등과 정치적인 논쟁이 되기도 한다(Cho, 2012).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원하청 구조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경비 업무, 청소 업무, 식당 운영 등과 같이 경영목적이나 이익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분야나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 분야에서 외부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긍정적인 상생협력 경영 방안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위험이 수반되는 기업의 핵심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는 현상은 사회윤리적인 문제를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라는 용어까지 생겨나게 하였다(Lee, 2020).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원청 근로자보다 어렵고 힘든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안전조치 수준은 낮은 편이어서 산업재해 위험은 높은 것이 현실이다(Choi et al., 2015).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제한하며,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에 개정되었다. 또한, 원청기업이 지원하여 하청업체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공생협력과 상생협력 프로그램(co-prosperity cooperative program)을 추진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물류 운영 방안(Bang and Yu, 2012; Yoo, 2011), 경쟁력 강화(Rhee et al., 2011), 연구개발 전략(Kim, 2009), 신제품 개발(Bae and Kim, 2007) 등에 관해서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규모 협력업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하청업체 간의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원하청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협력 실태를 주로 살펴보고 이에 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원청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원청의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협력업체와 관련된 원청의 제도적 현황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실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원청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112개 기업과 기관의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참여기업들을 규모로 구분하면 대기업, 중견기업, 기타(공공기관)의 수가 각각 53, 52, 7개이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의 응답 수가 각각 76, 28, 8개였다(Table 1). 설문 응답자들의 안전보건 업무 경력은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이 각각 39.3%, 20.5%, 10.7%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94.6%에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었다.
|
Size classification |
Sample size |
Industry classfication |
Sample size |
Headquarter and |
Sample size |
|
Large enterprise |
53 |
Manufacturing |
76 |
Headquarter |
46 |
|
Mid-sized enterprise |
52 |
Service |
28 |
Branch |
66 |
|
Others (Public enterprise) |
7 |
Others |
8 |
|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고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대기업의 상생협력사업 담당자(4명), 학계의 산업안전 전문가(2명), 안전보건연구원 및 안전공단의 전문가(2명) 총 8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개별 기업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발전 방안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3.1 Infrastructure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이나 조직이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각각 73.6%, 71.4% 수준이었으나 중견기업은 53.8%가 상생협력을 위한 전담 조직이 있다고 답하였다. Table 2에서와 같이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은 75.0%가 제조업은 60.5%가 상생협력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부서장이나 임원이 있는 경우(23.9%)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 전담 직원(28.3%)이 있거나 타 업무를 겸임하는 직원(25.0%)이 있는 정도였다.
|
Classfication |
Manufacturing industry |
Service industry |
Others |
Total |
|
Dedicated organization |
60.5% |
75.0% |
62.5% |
64.3% |
|
Regulation |
61.8% |
60.7% |
62.5% |
61.6% |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율은 각각 71.7%와 51.9%로 조사되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1.8% 서비스업이 60.7% 그 외의 업종이 62.5%로 나타났다.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원청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협력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 안전물품 지원, 수급업체 평가 가점 등으로 나타났다.
3.2 Support for partner companies
설문에 참여한 기업과 기관 중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비율은 74.1%이었으며 서비스 업종에서 관련 예산 편성 비율이 89.3%로 높게 나타났다(Table 3). 예산의 규모는 직접 지원의 규모가 컸으며 간접적인 컨설팅이나 인센티브 등도 있었으나 기업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하청업체 외에 지역사회의 안전보건과 관련해 원청업체가 지원하는 비율은 11.6%로 조사되었다.
|
Classfication |
Manufacturing industry |
Service industry |
Others |
Total |
|
Buget allocation |
71.1% |
89.3% |
50.0% |
74.1% |
|
Feedback system |
56.6% |
78.6% |
50.0% |
61.6% |
|
Incentive system |
47.4% |
50.0% |
37.5% |
47.3% |
Table 3에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하청업체와의 의사소통이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피드백 제도를 갖춘 원청의 업종별 비율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56.6%와 78.6%로 조사되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우수 하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갖추고 있는 원청업체의 비율은 47.3%였으며, 인센티브 제도 중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수급업체 선정 우대' 제도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납품단가 조정', '현금, 현물 지원', '물량배분 조정' 등의 순서로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가 크다고 응답하였다. 수급업체 선정에서 혜택을 주는 원청업체의 비율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31.6%와 21.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협력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이나 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기업들은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29.9%)을 지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안전보호구(23.1%)나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19.4%)하는 경우도 있었다(Table 4).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원청기업이 지원하고 있는 컨설팅 분야는 '위험성 평가(30.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16.8%)', '역량강화 교육(11.2%)', '안전보건관리대행(10.5%)' 순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지원은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 용역 비율이 35.8%, 자체 인력 활용 비율은 65.2%로 나타났다.
|
Hazard risk |
Personal |
Work |
Safety & health |
Safety & health |
Occupational |
Software |
|
29.9% |
23.1% |
19.4% |
12.6% |
5.1% |
4.4% |
2.0% |
3.3 In-depth interview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대표적인 기업들의 안전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생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기업들이 상생협력에 관한 조직을 구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청업체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의 책정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할 것이다. 협력업체들을 위한 지원이나 혜택에서도 기업마다 여건이 다르므로 우선은 지원 규모나 금액보다 제도 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우수한 협력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야 지속 가능한 원하청 협력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컨설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 같은 경우 하청업체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하게 되므로 효과도 좋으며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안전보건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담당자가 있는 수준이었다.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공용 시설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는 아직 널리 제도화 되지 못하고 있었다. 작업중지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원청은 많으나 실제로 하청업체의 직원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의 지원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비스 업종에서는 본사에서 주관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 정책과 방안을 수립하고 지사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작업중지권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원청과 하청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소협력업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원하청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련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원청기업의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의 대상이 상생협력사업의 참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 원청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청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지원은 연구 결과보다 미흡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전담 조직에 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는 전담 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전담 직원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타 업무를 겸임하는 전담 직원이 많아 향후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원청기업에서는 하청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하청업체에게 가장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수급업체 선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원청업체는 많지 않다. 이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다면 하청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원청기업은 하청기업의 산업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업 간 계약 및 인센티브 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원청기업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원청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청기업의 위험성 평가를 원청기업이 지원하는 것도 효율적인 하청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Kim, 2008). 본문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필요한 경우에 작업중지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References
1. Bae, Z.T. and Kim, J.H., Inter-Firm collaboration between large firms and SMEs in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es and government policies,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29(4), 295-318, 2007.
2. Bang, S.C. and Yu, K.H., A study on the efficient firm logistics in installing win-win cooperation,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13(1), 307-321, 2012.
3. Cho, S.J., Current status,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in-house subcontracting, Labor Review, 87(6), 5-16, 2012.
4. Choi, B.G., Yoon, S.J., Choi, S.Y. and Moon, K.W.,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the safety culture cognition of host company and subcontractor,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17(3), 173-183, 2015.
Google Scholar
5. Kim, B.G., A theory on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among capital and labor of large firms and their suppliers,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Studies, 67(3), 45-86, 2019.
6. Kim, B.S., Subcontractors protection scheme for harmful work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10(4), 153-158, 2008.
Google Scholar
7. Kim, K.C., R&D strategy and platform leadership at the eco-business system: Implication for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y,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31(2), 157-175, 2009.
8. Korea Labor Institute, Utilization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in-house subcontracting,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07.
9. Lee, C.Y.,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impact factors of subcontractor's industrial accidents using AHP, Master Thesis of Yeungnam University, 2020.
1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Guidelines for implementing safety and health co-prosperity program between large cooperation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partner companies, 2012.
11. Rhee, M.S., Park, S.B. and Jun, I.W.,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cooperative personnel, management performance and a win-win cooperation of large and small business, Korea Logistics Review, 21(5), 347-371, 2011.
12. Yoo, S.H., Buyer-Supplier collaboration and benefit-sharing strategy in a supply chain, Journal of the Korea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36(1), 69-84, 2011.
Google Scholar
PIDS App ServiceClick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