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SSN: 2093-8462 http://jesk.or.kr
Open Access, Peer-revie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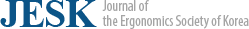
eISSN: 2093-8462 http://jesk.or.kr
Open Access, Peer-reviewed
Seok Hoon Yoo
, Kwang Tae Jung
10.5143/JESK.2025.44.3.379 Epub 2025 July 05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propose practical measures to prevent fall accidents in low-height elevated work environments (under 5 meters), which are frequently underestimated in terms of risk.
Background: Although low-altitude work environments are often perceived as relatively safe, they can lead to severe or fatal injuries due to insufficient use of protective equipment and limited availability of anchorage points. However, research focused on this context remains limited.
Method: A structured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100 workers from the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to assess the current status and awareness of safety harness usage. In addition, experimental fall tests using a 1.2m lanyard and a 1.5m self-retracting lifeline were performed by dropping a mannequin from a height of 2.3m, with anchorage points set at 3.5m and 2.9m. Previous studies and relevant safety regulations were also reviewed to support theoretical analysis.
Results: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over 90% of respondent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wearing safety harnesses. However, only 45% reported considering the concept of minimum fall clearance in practice. Experimental findings showed that at a 3.5m anchorage point, both types of equipment successfully prevented ground impact. In contrast, when the anchorage point was set at 2.9m, the mannequin reached the ground due to insufficient clearance after accounting for shock absorber extension, indicating the inadequacy of standard fall protection equipment in lower work environments.
Conclusion: Fall hazards exist even in low-elevation tasks, and ensuring minimum fall clearance through appropriate selection of protective equipment and anchorage point positioning is essential.
Application: This study presents practical guidelines for implementing effective fall protection in low-height work environments and provides a foundational reference for future regulatory improvements and safety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Keywords
Fall accident Minimum fall clearance Elevated work Safety harness Protective equipment Anchorage point Low-height work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추락사고는 국내의 산업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재해 유형 중 하나로 꼽힌다. 추락사고는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 전체에도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물류업 등 다양한 산업 군에서 작업 특성상 고소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추락사고는 산업재해 통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Ko, 2014).
2022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분석 자료(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2)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건수는 130,148건으로, 전년(122,713건) 대비 6.22% 증가하였다. 이 중 추락사고는 총 14,387건으로 전체 산업재해의 11.04%를 차지하며, '넘어짐'(19.24%) 및 '업무상 질병'(17.7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였다.
추락에 의한 재해는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하지만,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였다. 2022년 기준, 전체 추락사고 중 약 55%(7,912건)가 건설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건설업 특성상 고소작업이 빈번하고, 비계, 발판, 구조물 등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설업 내 전체 산업재해 대비 추락재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28.8%에 이르며,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을 시사한다(Kim and Shin, 2019).
건설업의 사업장 규모별 통계를 보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추락사고가 3,649건으로 전체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5~9인 사업장에서 940건(약 12%), 10~49인 사업장에서 1,501건(약 19%)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단 87건(1% 미만)만이 보고되었다. 이는 대규모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한 자원과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반면,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 · 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사고 예방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Kim and Shin, 2019).
제조업에서도 추락사고는 주요 재해 유형 중 하나로 나타났다. 2022년 제조업 전체 재해자 23,764명 중 2,192명이 추락사고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전체 제조업 재해의 약 9.2%에 해당한다. 제조업은 고소작업 비중이 건설업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상부 또는 복잡한 작업환경에서의 이동 중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663건(약 30%), 5~9인 사업장에서 342건(약 15.6%)이 발생하였고, 10~49인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였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2).
한편, 추락사고는 단순 재해를 넘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망사고 통계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22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874명이며, 이 중 322명이 추락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는 전체 사망재해의 36.8%로, 모든 재해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전체 사망재해 402건 중 215건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며, 이는 전체의 약 53.5%에 해당한다(Shin et al., 2014). 제조업에서도 184건의 사망사고 중 44건(23.9%)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통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되며, 전체 사망재해는 812건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86건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36건 감소한 수치로, 보호구 착용 의무화, 안전교육 강화, 작업환경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의 일부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추락사고는 모든 산업재해 유형 중 가장 높은 사망자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현장 중심적인 예방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된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3).
이상의 분석 결과는 추락사고가 산업재해 중에서도 빈도와 치명률이 모두 높은 재해 유형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추락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은 작업환경 요인, 작업자의 행동 특성, 그리고 안전 장비의 착용 여부 등을 추락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안전대의 적절한 사용과 설치 기준은 추락사고 예방의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중소형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Lee (2023)의 연구에서는 추락사고의 위험 요인을 통계적으로 도출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취약성을 지적하며, 현장 실태를 반영한 예방 방안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Sa et al. (2012)는 고령 근로자의 저층 배치와 안전관리자 권한 강화, 일용근로자 대상 안전체험교육 실시를 통한 예방 전략이 추락사고로 인한 재해 손실비용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Park (2022)는 추락사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학적 · 관리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Kim (2020)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중심으로 건설업 추락재해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적 정비 및 안전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Shin et al. (2014)는 작업발판 및 사다리의 불안정성과 안전난간 미설치 등 작업환경의 구조적 취약성이 주요 원인임을 분석하며, 장비 개선과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Lee et al. (2024)는 2m 미만의 낮은 작업고도에서도 추락사고가 다수 발생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고소작업 중심의 추락 예방 접근 방식이 작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저고도 작업에 적합한 안전대 설계와 적용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Kim et al. (2022)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고정점의 적정 설치 높이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내에 유통 중인 죔줄 및 충격흡수장치의 길이를 기준으로, 작업자가 추락했을 때 최하사점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고정점 높이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안전대 고정점은 최소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정점 설치 높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며, 연구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5m 이상의 고소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최근 사고 다발지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5m 이하의 저고도 작업환경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재해 유형 중 하나로, 특히 건설업, 제조업, 물류업 및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Jeong et al., 2020). 그 중에서도 작업 높이가 5m 이하인 저고도 고소작업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보호구 착용이 소홀히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낮은 높이에서의 추락 또한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고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낮은 고도의 작업환경에서는 안전대 착용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이유로 보호구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동이 잦고 공간이 협소한 환경에서는 기존의 안전대가 작업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인식되며, 이로 인해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증대된다. 더불어 작업환경과 안전대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은 부적절한 착용 및 장비 오사용으로 이어져, 보호구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실정이다. 안전대는 추락 시 작업자의 신체를 지지하고 낙하 거리를 제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적인 보호구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하사점(minimum clearance distance)'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작업환경에 적합한 장비의 선택 및 올바른 착용 방법이 필수적이다(Shin et al., 2014). 예를 들어, 1.2m 길이의 충격흡수장치 일체형 죔줄 또는 개인용 안전블록과 같은 보호구는 낮은 고소작업 환경에서 최하사점 확보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장비의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5m 이하 고소작업에서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에 적합한 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착용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건설 및 제조업 현장에서의 안전대 착용 실태를 조사하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보호구의 구조적 특성과 사용 조건을 비교 · 분석하였다. 특히, 다양한 길이의 죔줄과 충격흡수장치가 포함된 장비들의 실험적 검증을 통해 최하사점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현장 적용 가능한 착용 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안전대는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추락을 방지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개인 보호 장비이다. 특히 고소작업이나 건설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작업자의 신체를 고정시켜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대는 벨트식과 그네식으로 구분되는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벨트식 안전대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으므로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022).
안전대를 착용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최하사점이다. 최하사점은 작업자의 추락 시 로프의 지지 위치에서 신체의 하사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작업자가 추락할 경우 신체가 지면에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하사점이 바닥면 위쪽에 위치해야 한다(Kim et al., 2022). 최하사점의 개념은 고소작업에서 착용하는 보호구, 특히 안전대의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하고, 추락사고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고소작업에서 작업자는 항상 추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를 착용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안전대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안전대가 연결된 고정점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만 추락 시 작업자가 지면에 닿지 않고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최하사점의 설정은 고소작업에서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안전 요소라 할 수 있다(Kim et al., 2022; Kim and Cho, 2023).
최하사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안전대 죔줄의 길이이다. 일반적으로 고소작업에서 사용하는 안전대 죔줄의 길이는 약 1.8~2m로 설정되어 있다. 이 길이는 고소작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준 길이지만, 낮은 높이 작업에서는 너무 길어 오히려 작업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m 이하에서 2m의 안전대 죔줄을 사용할 경우 추락 시 안전대가 완전히 늘어나지 못하고 작업자가 지면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
고정점의 위치도 최하사점 설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정점은 작업자가 고소작업 시 안전대를 연결하는 고정된 지점으로, 작업자의 위치에 비해 고정점이 높게 설치될수록 추락 시 더 많은 거리를 완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작업에서는 고정점을 작업자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 추락 시 안전대가 충분히 늘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낮은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 고정점을 작업자 위치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점을 작업 위치와 가깝게 설치하여 최하사점을 확보해야 한다. 고정점이 작업 위치에 너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추락 시 안전대가 완충 기능을 발휘하기 전에 지면에 닿아버릴 수 있으므로, 낮은 높이 작업에서는 특히 고정점의 위치 설정이 중요하다.
또한, 충격흡수장치의 유무도 최하사점을 설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충격흡수장치는 추락 방지 장비 중 일부에 내장된 기능으로, 추락 시 안전대가 추가로 늘어나면서 충격을 흡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충격흡수장치가 있으면 작업자가 추락할 때 발생하는 가속도와 충격량을 완화하여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충격흡수장치가 있는 경우 안전대가 늘어나는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낮은 높이에서는 안전대가 늘어난 거리 때문에 오히려 지면에 닿을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작업자의 신체 조건과 보호구의 착용 방식도 최하사점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작업자의 신체 크기와 체중, 안전대 착용 방식 등은 추락 시 지면과의 거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작업자가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체형이 크다면, 추락 시 안전대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져 안전대가 더 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안전대의 길이와 고정점의 위치를 조정하여 최하사점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안전대가 잘못 착용되거나 장비가 불완전하게 고정된 경우, 추락 시 안전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안전 장비가 효과적으로 보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자의 신체 조건에 맞는 안전 장비를 선택하고, 올바른 착용 방식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하사점을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작업 현장에서는 고정점과 안전대의 위치를 철저히 점검하여 최하사점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작업자들에게 최하사점의 개념과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안전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낮은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안전대 죔줄로는 최하사점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장 맞춤형 안전 장비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자들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 장비의 착용 방식, 최하사점의 설정 기준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Kim et al., 2022). 일반적으로 그네식과 벨트식 안전대의 최하사점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그네식 안전대의 최하사점
그네식 안전대를 연결도구로 죔줄을 사용하여 착용하고 추락하게 되는 경우 로프의 고정점에서 최하사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 하면, R은 다음 수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h = L + D + R
여기서 L은 죔줄의 길이, D는 충격흡수장치의 감속거리(1m), R은 D링에서 작업자 발까지의 거리(1.5m)이다. 따라서 작업자의 추락 시 로프를 지지한 위치에서 바닥까지의 거리를 H라 하면 작업자의 바닥면 충돌 방지를 위하여 H>h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작업자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최하사점과 바닥면 사이에는 0.75m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여유거리 0.45m와 부착된 부재의 늘어나는 길이 0.3m를 합한 값이다.
벨트식 안전대의 최하사점
벨트식 안전대를 사용하는 경우의 최하사점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h = 로프의 길이 + 로프의 신장 길이(30%) + 작업자 키의 1/2
여기서 h는 추락 시 로프를 지지한 위치에서 신체의 최하사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로프를 지지한 위치(훅의 위치)에서 바닥까지의 거리를 H라 하면 H>h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5m 이하 고소작업 환경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의 선택 기준과 올바른 착용 방법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5m 이하의 고소작업 특성과 최하사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에 대한 현장 작업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안전대 착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설업 및 제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문항으로, 착용 빈도 및 회피 사유, 보호구 사용 경험, 착용 시 불편함, 사용상의 제약사항, 선호하지 않는 장비에 대한 의견,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여부, 교육 내용의 실효성 및 행동 변화 유도 효과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 대상은 하이테크(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군에서 고소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건설업, 제조업에서 활동하는 총 100명의 응답자가 참여하였다. 설문대상자의 성별은 전체 연구대상자 100명 중에서 남성이 93명(93%), 여성이 7명(7%)이었고, 설문대상자의 연령은 20대 7명(20%), 30대 23명(23%), 40대 49명(49%), 50대 20명(20%), 60대 이상 1명(1%)로 구성되었다. 설문대상자의 근무경력(작업경력)은 1년 미만 3명(3%), 1~5년 22명(22%), 5~10년 19명(19%), 10년 이상 56명(56%)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설문대상자의 소속분야는 건설업 67명(67%), 제조업 26명(26%), 기타 7명(7%)이었고, 관리자 59명(59%), 작업자 36명(36%), 안전감시(단순감시) 5명(5%)이었다.
실험연구에서는 5m 이하 고소작업에서의 추락사고에 대한 최하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사람과 같은 모형의 170cm의 공기주입형 마네킨을 사용하여 추락 실험을 수행하였다. 물론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95백분위수의 신장을 반영한 마네킨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추락 실험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에 인체측정치를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실험의 용이성을 위하여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네킨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는 마네킨에 안전대를 착용하고 죔줄과 개인용 안전블럭을 연결한 후, 3.5m, 2.9m 높이에 설치된 난간대에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2.3m 높이에서 마네킨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마네킨의 무게가 일반적인 사람 몸무게와 차이가 있어 충격흡수장치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흡수장치가 작동하였을 때의 최대 길이를 추가로 적용하였다. Figure 1은 실험 상황을 보여준다.

실험에 사용된 보호구는 1.2m 일체형 포이죔줄과 1.5m 개인용 안전블럭을 사용하였다(Figure 2). 선행연구를 통하여 1.8~2.0m 길이의 죔줄타입은 최하사점을 5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실험에서는 최하사점을 5m 이하로 할 수 있는 보호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은 먼저 3.5m의 난간대에 죔줄 및 개인용 안전블럭의 안전고리를 체결하여 마네킨을 추락시킨 후, 바닥에서 마네킨의 발바닥 높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2.9m의 난간대에 각각의 죔줄 및 개인용 안전블럭의 안전고리를 체결하여 마네킨을 추락시킨 후, 바닥에서 마네킨의 발바닥 높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4.1 Analysis of safety harness usage practices
고소작업 현장에서의 안전대 착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평소 안전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로부터 평상시 안전대 사용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사용하는 안전대의 유형으로는 그네식 안전대가 78%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상체식 벨트형은 21%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실제 고소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이 보다 안전성이 높은 장비를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상체식 벨트형의 사용자는 관리자 등 실제 고소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인력일 가능성이 높다.
추락 방지 장치 체결 유형으로는 죔줄 사용이 53%로 가장 높았으며, 복수응답자 중 일부는 죔줄과 안전블록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용 안전블록에 대한 인식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응답자가 장비명을 혼동하여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안전 장비의 규격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1%의 응답자가 착용 중인 죔줄 또는 안전블록의 길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19%는 자신이 사용하는 장비의 세부 사양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최하사점(minimum fall clearance)'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직결되며, 교육을 통해 이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안전고리(후크)의 고정장치 체결 여부에 대해서는 93%가 항상 체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는 '가끔 체결한다'고 응답하였다. 고정하지 않는 이유로는 고정점 부재(21%), 이동의 불편함(11%), 최하사점 미충족(4%) 등의 환경적 요인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고정설비 설치 미비와 사용자 불편감이 안전수칙 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안전대 사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 중 29%는 작업환경(고정점 부재, 최하사점 미충족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11%는 안전대 착용 자체의 불편함을 언급하였다.
최하사점에 대한 인지 여부는 92%로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로 이를 안전고리 체결 시 고려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즉, 이론적 인식은 높지만 실천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습 중심의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안전대 사용 개선에 대한 제안으로는 자동 감지 시스템 도입, 추락 거리 표준화, 작업 전 사전계획 수립 절차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단순한 장비 제공이 아닌, 시스템적 · 공학적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4.2 Safety awareness and training practices
안전대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8%가 안전대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0%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안전대 착용에 관한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을 보여주는 결과이나, 실제 착용의 정밀성과 관련된 인식 및 행동에서는 일부 격차가 존재하였다.
안전대 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 요소로는 보호구 추가 착용(34%), 안전의식 향상(29%), 안전시설물 설치(27%) 등이 주요하게 언급되었다. 이로 보아, 종합적인 보호 체계와 작업자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중 96%는 안전대 착용 및 추락 방지 시스템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매월 실시되는 정기교육이 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9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교육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추가 교육 필요 사항으로는 추락체험 실습, 비정형 작업에서의 적용 방법, 추락 시 대처법 등 실천적 내용이 주로 언급되었으며, 단순 이론 중심 교육에서 체험형, 현장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교육 개선 방향으로는 교육대상자의 안전의식 함양, 체험 중심 콘텐츠 강화, 공감형 자료 활용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안전대 지급 시 교안 제공, 반복 학습 체계 구축, 상황별 대응 시뮬레이션 등 교육의 질적 고도화가 요구되었다.
3.5m 고정점에 안전고리를 체결한 후, 2.3m의 높이에서 10회 추락 실험하여 평균적인 여유높이의 확인 결과, 포이죔줄 1.2m의 경우 여유 공간이 0.95m로 측정 되었으며, 개인용 안전블록 1.5m의 경우 1.4m의 여유 공간이 측정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사람의 몸무게와 동일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충격흡수장치가 동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충격흡수장치의 최대 길이를 반영하여 Table 1과 같이 최종 여유높이를 도출 하였다. 최종 여유높이는 포이죔줄에 대해서는 0.45m, 개인용 안전블록에 대해서는 0.4m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는 170cm의 마네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30~35세의 95백분위수의 신장 (182.8cm)을 적용하면, 최종 여유높이는 1.2m의 포이죔줄에 대해서는 0.33m, 1.5m의 안전블록에 대해서는 0.28m가 된다. 따라서 안전대 사용시 3.5m 이상의 높이에 안전대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추락하는 경우에도 바닥에 닿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Type |
Integrated lanyard (1.2m) |
Personal retractable lifeline
(1.5m) |
|
Anchor point height |
3.5m |
|
|
Work (fall) height |
2.3m |
|
|
Manikin height |
1.7m (1.5m from foot to
D-ring) |
|
|
Post-Experiment clearance height |
0.95m |
1.4m |
|
Shock absorber deceleration
distance |
0.5m |
1m |
|
Final clearance height considering
shock absorber |
0.45m |
0.4m |
그리고 2.9m 고정점에 안전고리를 체결한 후, 2.3m의 높이에서 10회 추락 실험하여 평균적인 여유높이 측정 결과, 포이죔줄 1.2m의 경우 여유 공간이 0.4m로 측정되었으며, 개인용 안전블록 1.5m의 경우 0.75m의 여유 공간이 측정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사람의 몸무게와 동일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충격흡수장치가 동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충격흡수장치의 최대 길이를 반영하여 아래 Table 2와 같이 최종 여유높이를 도출하였다. 최종 여유높이는 포이죔줄에 대해서는 -0.1m, 개인용 안전블록에 대해서는 -0.25m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는 170cm의 마네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30~35세의 95백분위수의 신장(182.8cm)을 적용하면, 최종 여유높이는 1.2m의 포이죔줄에 대해서는 -0.22m, 1.5m의 안전블록에 대해서는 -0.37m가 된다. 따라서 안전대 사용 시 2.9m 높이에 안전대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바닥에 추락함을 알 수 있다.
|
Type |
Integrated lanyard (1.2m) |
Personal retractable lifeline (1.5m) |
|
|
Anchor point height |
2.9m |
||
|
Work (fall) height |
2.3m |
||
|
Manikin height |
1.7m (1.5m from foot to D-ring) |
||
|
Post-Experiment clearance height |
0.4m |
0.75m |
|
|
Shock absorber deceleration distance |
0.5m |
1m |
|
|
Final clearance height considering shock absorber |
-0.1m (Fall to the lower level) |
-0.25m (Fall to the lower level) |
|
이상의 실험을 통하여 안전대 착용 후 추락 위치 및 고정점 높이에 따른 실제 추락사고의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 3.5m 이상의 고정점에 1.2m 일체형 포이죔줄 및 개인용 안전블록을 체결하였을 경우 바닥에 추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2m 이상의 고소작업에서는 최소 어깨높이 이상의 고정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머리 위에 고정점을 확보하였을 경우 더 많은 여유높이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2m 일체형 포이죔줄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용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것 보다 최하사점 확보에 더 바람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5m 이하 고소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비록 낮은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추락은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저고도 작업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대 선택 기준과 올바른 착용 방법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산업재해 통계를 통해 추락사고가 산업 전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건설업 및 제조업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는 낮은 고도의 작업환경에서 추락 위험이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안전 장비의 착용과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고소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실태와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작업자들이 안전대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최하사점 확보에 대한 실천적 이해와 적용이 부족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고정점 부족, 착용의 불편함, 장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안전관리 실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실험연구에서는 1.2m 포이죔줄 및 1.5m 개인용 안전블록을 사용하여 2.3m 높이에서 마네킨을 추락시키는 실험 결과, 고정점이 3.5m일 경우 최하사점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고정점이 2.9m로 낮아질 경우 최하사점 확보가 불가능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충격흡수장치의 작동 여부와 길이를 고려한 계산을 바탕으로 재확인되었으며, 고정점이 어깨 이상 높이에 설치되지 않으면 지면 충돌 위험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결과적으로, 5m 이하의 저고도 고소작업에서도 추락에 의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보호구의 선택, 최하사점 확보, 신천적 안전교육 강화, 장비 표준화 및 표시 개선 등이 필요하다. 5m 이하 고소작업에서는 1.2m 이하의 짧은 죔줄 또는 개인용 안전블록을 사용하여 최하사점 확보가 가능한 안전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안전대 사용에서의 최하사점 확보를 위하여 최소 어깨높이 이상의 고정점 설치를 의무화하고, 현장 조건에 맞는 고정장치 설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실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마네킨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인체치수를 반영한 마네킨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안전문제를 확보한 상태에서 실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다 정교한 실험 설계가 필요하며, 인체치수를 반영한 마네킨 제작 및 다양한 작업환경에서의 실험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Jeong, E., Choi, J.W. and Lee, C., The Relationship between Unsafe Acts and Fall Accident of Workers Using ETA,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21(3), 28-38, 2020.
Google Scholar
2. Kim, D. and Shin, Y., A Study on the Risk Factor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Falling Accidents in Construction Site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19(2), 185-192, 2019.
Google Scholar
3. Kim, N.S.,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accident cases in multi-use facilities: focusing on the harm and hazard prevention plan, Master Thesis, Joongang University, 2020.
Google Scholar
4. Kim, S. and Cho, G., A study on the drop allowance distance according to the sagging of the horizontal lifeline during high-altitude work in a large chemical plan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4(3), 423-429, 2023.
5. Kim, S., Han, Y., Lee, M. and Cho, G., A study on the selection of fixed safety points considering the lowest clearance dista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5), 533-539, 2022.
6. Ko, Y., A Study on Prevention of Middle and Old Aged Worker Fall Accident at Construction Site, Doctoral Thesis, Myeongji University, 2014.
7.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Guidelines for using seat belts (KOSHA Guide C-33-2022), 2022.
8. Lee, J., A Study on the Derivation of Risk Factors for Safety Accidents in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Works -Focus on Fall accidents-, Master Thesis, Ulsan University, 2023.
9. Lee, J., Shin, S., Lee, E. and Park, H., A Study on Safety Measures for Work at Heights with Fall Risk,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24.
1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ual Report on the Status of Industrial Accidents 2022 (Focusing on Occupational Accidents Cover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2022.
11.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ual Report on the Status of Industrial Accidents 2023 (Focusing on Occupational Accidents Cover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2023.
12. Park, J.,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fall accident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Doctoral Thesis, Hanyang University, 2022.
13. Sa, Y., Choi, S., Cho, Y. and Lee, T., Cost Analysis of Fall Accidents in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5(1), 1-6, 2012.
Google Scholar
14. Shin, U., Jeong, S. and Lee, R., A study on the causal analysis of death accidents by the falls in the construction sites,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16(4), 63-69, 2014.
Google Scholar
PIDS App ServiceClick here!